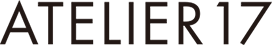15 3월 이대부중정문
개요
건물명 이대부중 정보관, 정문
설계소묘
모교를 다시 찾았다.
길은 더 넓어지고, 학교 앞 작은 가게, 분식집은 크고 화려한 건물들로 바뀌었지만, 학교는 그 때 그 모습에서 변한 게 없어 보였다. 해가 잘 드는 화단엔 여전히 그 자리에 목련이 있고, 운동장 담장 옆 무성하던 등나무 덩굴도 더 커진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꽤 크게 느껴지던 운동장은 오히려 작아 보였다. 시간이 흐르고 변하지 않은 것을 찾기 어려운 요즘, 바뀌지 않고 그렇게 우리 학교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반가웠다. 왜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미 고등학교는 옮겨갔지만, 늘 함께 학교를 다니던 중학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종이 울리고 뛰어나오는 학생 속에서 내가 아는 누군가가 있을 것만 같았다. 매 학년 내가 앉아있던 그 교실을 찾으며 다시 그 자리에 앉고 싶었다. 하루만이라도, 아니 한 시간의 수업시간이라도 다시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수업 중인 교실 뒷문을 소리 없이 열고 들어가고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계단은 그 때 그 모습 그대로 스무 해도 훨씬 넘은 시간을 건너뛰어 날 알아보았다. 계단 손스침을 손으로 쓰다듬어 보게 된다.
뒷마당에 있던 화장실은 없어졌다. 수도를 돌리면 따뜻한 보리차가 나와 노란주전자에 담아 교실로 나르던 수돗가도 안보였다. 대신 학생급식에 필요한 건물과 작은 매점이 숲 그늘에 가려져 있고, 학생들이 많이 찾지 않는 듯 바닥이 거칠었다.
내 아이 같은 후배들은 지금 학교에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많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 각자의 가슴에 남아 때때로 궁금한 학교는 무엇일까. 내 기억을 담아낸 집에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머물 학생들은 어떤 기억을 만들어 간직할까.
정보관이라는 이름으로 도서관, 서너 학급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음악실과 같은 작은 강당, 컴퓨터실이 학교에 필요하다고 했다. 예전 운동장 한 구석, 철봉대 모래밭이 있는 곳이 새 건물을 짓기에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크지 않은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지 않았다. 또 학생들과 선생님이 항상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외부 손님들도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적당한 다른 장소를 찾고 싶었다. 지금의 학교 건물의 모습을 가능한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그 건물 가까이에서 다른 분위기로 어울리는 별채와 같이 느껴지는 집이면 좋을 것이다.
학교 건물은 ‘ㄱ’자로 꺾어져 있고 건물 모서리 가까이에 계단이 있다. 이 계단을 함께 쓰는, 학교 뒤뜰 위로 떠 있는 집을 생각해 보았다. 이곳은 이화여대로 이어지는 쪽문을 향하여 완만히 올라가는 경사지다. 이 곳엔 두 학급쯤 야외수업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모여 합창대회 준비도 할 수 있으며, 또 몇몇씩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쉴 수도 있는 곳으로 이화여대 쪽의 무성한 숲으로 둘러싸여 아름다운, 열린 야외교실이 될 것이다. 그 교실 바닥은 나무데크면 좋을 것이고, 숲과 어울리도록 나무로 감싸여진 건물이 위에 있으면 그 공간은 더욱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리라 생각되었다.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고, 비가 와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다. 땅과 만나는 건물의 아래층을 이렇듯 시원하게 비워놓고 2층 높이의 뒤편 위쪽부분에 건물로 들어가는 계단을 만든다. 건물로 올라가면 학교와 연결된 계단 앞으로 컴퓨터실을 만들고, 전망이 시원하게 열린 쪽으론 강당을 놓았다. 강당은 강단을 향하여 몇 개의 단이 있는, 공연도 하고 수업도 할 수 있는 곳이다. 강당의 경사바닥으로 그 아래 열린 교실은 더 많이 외부로 위가 들려지도록 만들어 더욱 탁 트인 곳이 된다. 건물1층 열린 교실은 뒤쪽 높은 곳은 높이가 낮고 앞쪽 낮은 곳은 천정이 높아 건물의 바닥과 땅의 높이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만나는 변화가 많은 공간이다. 강당 밖으로 발코니를 만들어 강당에서 벌어지는 행사 사이에 밖으로 쉽게 나가 쉴 수 있는 장소가 된다. 숲으로 이어지는 발코니를 통해 강당엔 커다란 나무의 푸른빛이 가득 채워지도록 만들고 싶었다.
내가 학교를 다니던 70년대 후반 학교 도서실은 이화여대를 향한 4층 모서리에 있었다. 한 여름 더위는 창밖 은사시나무 이파리를 하얗게 뒤집어주던 바람으로, 그 위로 떨어지는 굵은 빗방울을 오래 바라보며 지나갔었다. 강당 위층에 들어설 도서관 밖 풍경도 그렇게 만들고 싶었다. 도서관 세면이 밖으로 열려있어 하늘에 떠 있는 느낌이 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건물 옥상에 이화여대 캠퍼스의 숲 위로 열려있는 하늘마당을 만들었다. 역시 학생들이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건물의 1층, 옥상, 그리고 곳곳의 발코니로 학교건물 안에서도 다양한 느낌의 외부공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학교에 들어와도 건물 안에 갇혀있는 느낌을 주고 싶지 않다. 이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용할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다. 지금은 없는 UN데이 행사가 다시 벌어진다면, 얼마나 그 장소들이 잘 쓰일 수 있을까 상상해 본다.
동문들의 도움으로 건물의 외벽을 나무로 만들 수 있었다. 공중에 떠 있는 느낌에 어울리게 전체 건물이 하나의 나무 덩어리로 느껴지도록 만들었다. 적삼목 널은 아름다운 나무결과 자연의 나무 색이 잘 드러나지만, 몇 년이 지나면 반짝이는 은회색으로 조금씩 바뀌어 갈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정답게 낡아가며 주변 숲과 더 잘 어울리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싶다.
이대부중 정문을 다시 짓는 일을 이어서 하게 되었다.
오래된 정문과 수위실은 많이 고치기나 다시 만들어야 할 만큼 낡았다. 버스전용차로를 만들며 정문 앞 보도가 좁아지기도 하였고, 운동장 가운데로 난 정문은 학교를 드나드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편한 위치는 아니었다. 운동장을 더 넓게,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가깝게 정문을 옮기는 것이 좋았고, 정문에서 학교건물의 입구까지 흙을 밟지 않고 갈 수 있다면 실내 환경도 훨씬 좋아질 것이다.
학교 앞 언덕길을 올라가며 학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조형물과 같은 정문이 되길 바랬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또 동문들에게 기억되고, 자부심을 주는 정문이어야 한다. 위압적이지 않는 친근하며, 미래지향적이고,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학교 정문이 되면 좋을 것이다.
단단하고 굳센 느낌의 노출 콘크리트로 두 개의 벽을 만들었다. 하나는 눈에 잘 띄게 높게 만들고 하나는 드나들기에 편한 높이로 만들고, 양쪽 벽 위를 “ㄱ”자로 꺾어 문을 에워싸는 느낌이 들게 하였다. 낮은 쪽은 비가 오면 잠시 머물 수 있게 만들었다. 길에서 운동장으로 조금 올라오는 경사바닥도 콘크리트로 만들어 전체적으로는 교문부분이 “U”자 모양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감싸 안는 모습이 된다. 높은 벽은 언덕길에서 잘 보이는 각도로 꺾여있어 마름모꼴의 벽 마구리 모습으로 두터운 콘크리트 벽이지만 가볍고 경쾌한 느낌, 비정형의 변화로 작은 파격을 만들었다. 문은 셋으로 나뉘어 접어서 여는 문이다. 무거운 철골구조로 만들 수밖에 없지만, 내부 지지구조 틀을 나뭇가지 모습으로 표현하여 가볍게 느껴지도록 하였다. 학생을 자라나는 나무에 비유한 조형으로 누구나 정다운 느낌이 교문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하지 않아도 이대부중만의 개성이 돋보이는 정문을 만들고 싶었다.
건물이 완성되고 건물 준공을 위한 행사가 신록이 아름다운 봄, 개교기념일에 즈음하여 있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1층 열린교실에 앉아 있었다. 웃음소리와 간간이 터지는 박수소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즐겁게 작업하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건축가로 내 소중한 모교에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너무 큰 행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공부한 자유로운 분위기의 이 학교가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의 나는 건축가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란 느낌을 항상 갖고 있다.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후배 그 누군가도 그렇게 자랄 것이다. 이대부중 교육정보관, 이대부중 교문 두 작업으로 말없이 후배와 모교 선생님들과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또 계속 이어지기를 꿈꾼다.